이번 노벨상의학상 수상자 중 한 명인 중국의 투 유유 교수가 개발한 약물이 우리나라의 천연물 의약품과 가깝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물론 천연물의약품이기에 노벨의학상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전통의학이 의학적으로 높은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투 유유 교수가 개발한 약은 말라리아 치료제로, 중국 전통 약재인 청호(靑蒿, 개똥쑥)라는 약재에서 항 말라리아 성분을 추출한 것이다. 이 약은 ‘아르테미시닌’으로 명명됐고, 100만명이 넘는 말라리아 환자를 구했다.
이같은 성과 뒤에는 마오쩌둥이 있다. 1950년 첫 전국보건위생회의에서 보건 4원칙의 하나로 ‘중의(中醫)와 서의(西醫)는 서로 단결해야 한다’는 ‘중서 결합 방침’을 내세우면서 1955년 중국중의연구원(2005년 이후 중의과학원으로 변경)을 만들었다.
이 중의연구원에서 투 유유 교수가 개발한 것이 바로 ‘아르테미시닌’이다.
비과학적이며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중의학에 대한 비판과 불신이 투 유유 박사의 수상으로 어느정도 해소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을 결합한 중국의 성과로도 해석된다.
이번 노벨상 수상만 갖고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이 협력, 혹은 배타적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것은 섣부를 수 있다. 하지만 서양의학과 전통의학이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고, 천연물의약품 성과에 대해 폄하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제약업계는 중국이 부러울 수밖에 없다.
물론 중국의 ‘아르테미시닌’이 천연물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의학계 일각에서는 중약(中藥)은 한의약과 같은 것이므로 한약을 개발·발전시켜야지 지금과 같은 천연물신약을 개발하는 것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세계 어디에서도 천연물신약에 대한 유효성과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여기에 법이 잘못됐다며 천연물 신약 허가를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논란이 거세다.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고민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잘못됐다고 없애자는 말은 그나마 얻은 성과물을 포기하자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의(韓醫)와 서의(西醫)는 서로 단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인지, 왜 전통의학과 양의학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이러니 양의와 한의가 진정한 의학에는 관심이 없고 서로 밥그릇 싸움만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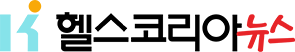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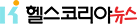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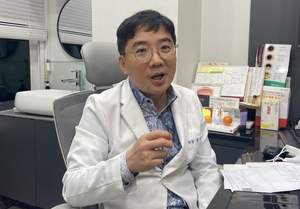
맨날 과학적이지 않다고 비난하는데, 정작 과학화하는걸 반대하는건 양의사들 아닌가요?
연구 안한다고 비난할수는 있는데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말라리아 연구를 진맥만하고 침만놓고 할순 없자나요...
안하는게 아니고 못하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