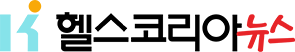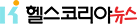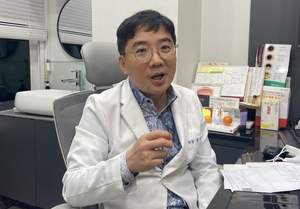그 까닭은 무엇일까? 이 단체가 정말 부도덕하고 후안무치한 사람들로만 구성돼 있어서 그랬을까? 그러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 이면에는 리베이트에 대한 다국적제약사의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리베이트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돼 왔다. 미국 아메리칸대학교의 네이션 멘틀이라는 학자는 담배회사에 유익한 8문단 짜리 의견서를 미국의학협회 저널에 쓰고 1990년대 당시 돈으로 1만 달러를 받았으며 암전문가 지오 바타고리는 란셋, 국립암연구소 저널등에 의견서를 보내고 2만 137달러를 챙겼다.
와이어스 아이어스트가 개발한 다어어트 약 '콤보펜펜(Combo fen-phen)'과 관련해 회사가 유령작가들에게 이 약의 우수성을 선전하는 글을 작성토록 하고 이 중 2편은 다른 유명학자의 이름으로 미국의학저널에 발표되기도 했다.
물론 이 약은 폐질환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었으나 교묘하게 조작되고 은폐됐으며 1997년 9월, 리콜되는 운명을 맞았다.
때론 기자들이나 홍보전문가들도 이런 조작된 여론 몰이에 동원되기도 한다. 제약사들은 이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와 부작용을 숨긴 데이터를 내놓기 마련이다. 이런 유혹은 저명한 잡지 메디칼트리뷴이나 뉴잉글랜드의학저널에도 종종 일어난다.
기사의 내용과 결론을 규제하는 보이지 않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해 자유로운 언론이나 의사 혹은 병원은 거의 없다.
1986년 뉴잉글랜드의학저널은 약 제조사에 우호적인 한 논문을 게재하면서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한 다른 논문의 게재를 거절한 바 있다,
그런데 우호적 논문의 저자는 제조사로부터 160만 달러를 기부 받았으나 반대 논문 저자는 지원받기를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반대 논문을 쓴 저자가 오히려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대학이 제약사의 후원을 받은 저자의 편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이후에도 비일비재하다. 앞으로도 병원이나 의사들이 제약사에서 받는 리베이트는 더욱 교묘해져 갈 것이며 언론도 그 치정기 섞인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재정적 독립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개인사를 탐구했던 19세기 과학자들과 달리 오늘날 주류 과학자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연구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당연히 많은 기부자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시각이나 논리라면 “리베이트가 시장경제의 한 거래 형태”라는 주장도 공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거나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는 없다. 소소한 방식으로 진실의 방향을 뒤틀어 버리려는 왜곡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무릇 어떤 관행은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든 부정의한 것이든 자리 잡고 나면 상식으로 굳게 된다. 바로 리베이트가 그렇다. 상식은 보편성을 지닌다. 그러다 보니 이익단체간 공감을 획득하고 부정은 티끌 만해져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익숙하고 당연한 것에 대한 반성은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일에 무감각해져 있을 관련단체나 당사자들은 새해를 맞아 “리베이트가 시장경제의 한 거래 형태”라는 강변을 곰곰히 되새겨 보면 어떨까.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