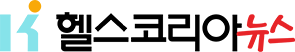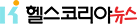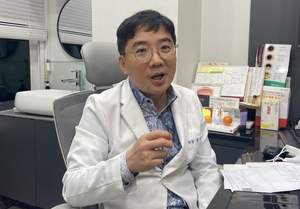식약청에 따르면 태아 초음파 촬영의 경우 우리나라 임산부들은 평균 10.7회를 받고 있다. 이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통상 3회에 비하면 매우 높아 우려되기도 한다.
식약청의 이번 우려 섞인 주의 촉구는 초음파 검사의 유해성등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지등을 자주 점검해 보려는 태도의 과다여부가 문제 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2007년 말 “초음파 촬영이 완전히 무해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식약청의 이번 발표는 국민건강을 위한 보호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식약청의 발표를 놓고 의심스러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식약청이 2002년과 2007년 유럽 초음파 안전성 위원회(ECMUS)가 실시한 연구등을 간과하고 위해성만 과장한다는 것이다. 당시 연구에서는 진단 목적의 산전 초음파는 소아기 암, 저체중, 신경학적 발달, 언어장애 등과 연관이 없다는 보고서가 나온 바 있다.
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제산부인과 초음파학회(ISUOG)도 일반적인 진단목적으로 사용하는 B-mode, M-mode의 초음파는 임신 전 기간 동안 안전하다고 공표한 바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미국 FDA는 ‘상업용’이라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임산부 초음파 검사 사용에 대해 자제 권고를 한 바 있어 일부의 이런 주장은 좀 명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번 발표가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검사를 많이 하게 되면 의사나 병원으로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불필요한 검사를 남발 하게 되는데 이를 줄여 보자는 것이 식약청의 숨은 의도라는 것.
그러나 이 역시 일부 의사나 병원들이 의료현장에서 과잉진료를 빈번하게 행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러한 견해에 전부 동조할 수는 없다.
이런 논란에 대해 식약청은 억울한 면이 있을 것이다. 국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학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책임도 있기 때문에 본분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학정보일 수록 정책적 목적에 대한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거를 명확히 알려야 할 것이다. 이번 발표는 그러한 근거제공이 미약했지 않았나 하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다. 식약청은 보다 정확한 연구논문이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줘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