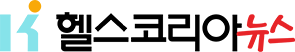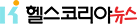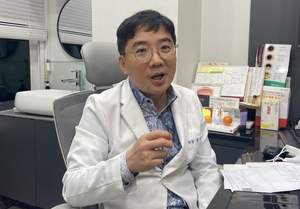17일 정부가 내놓은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2010∼14)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4년까지 모든 농어촌에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다.
이 안에 따르면 응급환자가 생기면 응급장비를 갖춘 구급차가 30분 안에 도착해 응급처치를 한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 군지역에는 응급의료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6개 권역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기로 했다.
그간 지방 농어촌지역 의료공백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소규모 농어촌지역은 병원급 의료시설을 찾기가 힘들다. 그나마 있던 병원도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있다. 완전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 아닌 바에야 누적되는 적자를 안고 가는 병원은 없다. 이러다 보니 의료체계는 무너지고 실업률까지 늘어나 지역 경제에 까지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한 반중에 응급환자가 생기면 중소도시로 가야한다. 심장마비등 생명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주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야말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 사회복지망이 구멍 난 상태로 이제까지 방치한 책임이 크다.
더군다나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농어촌 지역 사회는 응급의료 수요가 많아 도시지역보다 오히려 응급대처 전문 인력과 의료시설 확보가 더 절실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현실은 정반대로 농어촌지역의 소외감이 크다.
전국적으로도 응급의학전문의 가운데 절반이상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농어촌지역은 산부인과 등도 찾기 힘들어 산모들이 아이를 낳을 때면 사전에 도시지역으로 나가 해산을 준비한다고 한다.
보건산업진흥원은 2013년 경 공중보건의 숫자는 현재 절반으로 감소해 농어촌 보건의료 지원인력 확보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분석했다.
의학전문대학원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 대부분이 군대를 다녀온 상태에서 다시 학교에 다니게 돼 군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는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때문이다.
국민 건강권은 기본권으로 최소한 응급치료라도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마련해 줘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정책 뿐 아니라 앞으로도 장기적이고 차별화된 의료지원 정책을 펼쳐 농어촌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